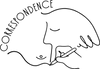CORRESPONDENCE makes a connection between two locations, to create objects for your own destination.
There is an invisible line between the desk that writes the dearest letter and the mailbox that sincerely receives it.
CORRESPONDENCE is a handmade exchange between a selection of independent makers in Korea and New Zealand. Built from an alphabet of necessities, in a directory of materials, the gesture results in an index of everyday object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material, crafted from paper, wood, clay, metal and textiles, CORRESPONDENCE’s objects are shaped by hand, bound to the impulsive behaviors of the body, and brought together to form a conversation of life between two grounds.
Born from a frustration that both countries had limited keywords for each other’s respective beauty, CORRESPONDENCE introduces the genuineness of Aotearoa to the delicacy of Korea, and vice versa, like an exchange of tangible love letters. It is with this gesture that a mutual creative dialogue can strengthen and grow between the two countries.
Handled with intention,
enveloped with care,
and stamped with affection.
“I tore open the letter and licked the envelope’s seal for any lingering taste of you." — Emily Dickinson
Words written by Yasmine Ganley
—
집과 집, 눈과 눈, 손과 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총체적으로 물질적인 공간 속에서 있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곧 실패한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부가될 것인데, 베케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항상 정신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한편으로는 감긴 채 부릅뜬 눈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물체로부터 다시 스며 나오는 말들이다." — Alain Badiou
여름. 눈을 감고 본다. 여기라면 눈을 감아도 눈 안에 이곳의 전부를, 이곳이 전부인 세계를 옮겨둔 것처럼 훤하다. 언제나 어슴푸레한 어둠. 펄펄 끓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여름 강변과 강 너머로 지는 해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앞유리가 그것을 반사하며 실어 나르는 것. 강변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불빛들, 꿈까지 따라올 기세로 이어지는 그것들을 보며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고 있는 얼굴들. 불철주야 사이로 번져오는 아침. 물 앞에서도, 햇빛 앞에서도, 불빛 앞에서도 바다를 생각하기. 눈을 뜨면 언제나 멀리 있는 바다를. 거의 모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가까운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들을.
겨울. 눈을 뜨고 거기로 가 있는 여름을 상상한다. 이미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크린에 저장된 것인지, 기억에 저장된 것인지 이제는 흐릿한 장면들. 길고 흰 구름을 닮은 땅, 실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어슴푸레한 장면 속의 선명한 환함과 어둠을. 무심코 등을 기댔던 나무, 낯설고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가 움켜쥐고 있던 나무, 보드라운 빛깔의 이끼로 뒤덮인 나무를. 그 나무들의 껍질 아래 어떤 무늬가 숨어있는지 빵에 잼을 바르며 알게 되는 일을. 본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곁에 있는 해변들을.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바다를.
생각한다.
날아가고 날려 보내는 일을. 어떻게 함께일지를.
무언가를 더하기 말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말고,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은 말고
연결된 눈과 눈을, 손과 손을, 집과 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수신인이 적히지 않은 편지들을. 받아든 이는 누구라도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이 수신자라고 느끼게 되는. 우편엽서에 적혀 있어 오가는 길에 그것을 마주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연결된 손, 연결된 책상이 만들 풍경을. 사물 하나를 몇 날 며칠이고 응시하는 형형한 눈동자의 빛을. 사물에게 시선을 주려는 듯이, 사물에서 새어 나오는 시선을 마주하듯이. 어느 때고 형형한 눈동자, 끝이 야무진 손길로 빚어낸 날씨와 생활의 여운이 비치는 사물들을.
집을 소유하기 말고 집을 만들기.
얼기설기 직조된 여러 개의 삶.
형형한 눈동자로 각자의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환한 방에서, 꿈에 사로잡힌 채.
침침한 방에서, 생활에 속한 동작으로.
각자의 방에서 함께.
사라지는 안팎과 우정을 예감하며.
Essay written by Liyoun Kim
—